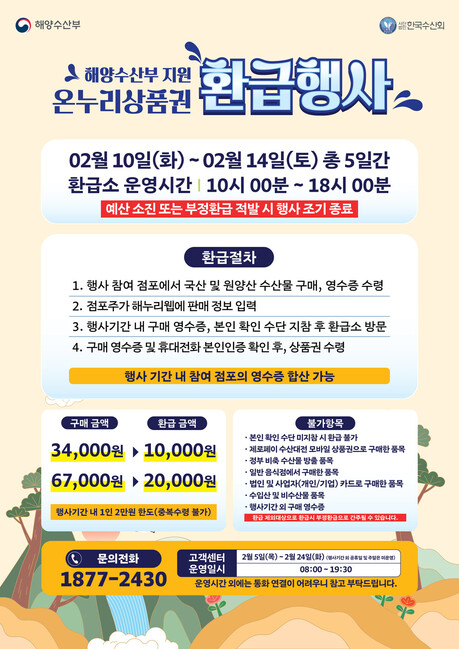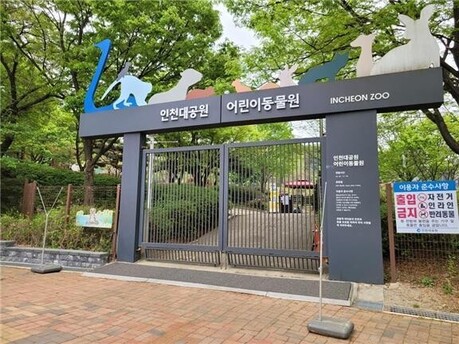왕실부터 현대까지, 과학이 입증한 한우의 가치

[농축환경신문]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쉽게 떨어져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한국인의 대표 보양식으로 자리 잡은 한우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오랜 세월 ‘약’으로 불릴 만큼 귀하게 여겨져 왔다. 조선시대의 고문헌부터 왕실의 수라상, 장수 인물들의 식습관, 그리고 오늘날 과학적 분석에 이르기까지, 한우가 지켜온 보양의 역사는 한국인의 건강과 삶의 방식 속에 깊게 스며 있다.
▲ 옛 문헌이 전하는 ‘약이 되는 음식’ 한우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소고기는 몸을 회복시키는 대표적인 ‘약식(藥食)’이었다. '동의보감'에는 “소고기의 성질은 평이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비위를 보하고 설사를 멎게 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소갈(당뇨)이나 부종을 낫게 하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하게 한다는 설명도 확인된다. 이는 당시 흔했던 영양 결핍과 질환 속에서 소고기가 중요한 치료 음식으로 쓰였음을 보여준다.
'지봉유설' 역시 소고기를 즐겨 먹은 인물이 90세가 넘도록 장수했다는 사례를 전하며, 소고기가 장수와 건강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소고기를 제허백손(諸虛百損, 모든 허약증)을 보하는 재료로 설명하며, 소의 각 부위가 사람의 신체를 보완한다는 인식이 이어져 왔다.
▲ 세종대왕의 수라상에서 장수 인물의 식탁까지
소고기의 가치는 왕실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세종대왕은 고기가 빠진 수라상에서는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소고기를 즐겼다는 일화가 전해지며, 태종 또한 “임금은 하루라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을 만큼 소고기는 왕실 건강을 돌보는 데 빠질 수 없는 귀한 식재료였다. 세종은 충직한 신하에게 한우 고기를 하사해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는데, 이는 한우가 권력과 보상의 상징으로도 쓰였음을 의미한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고기(肉)’ 관련 사례만 세종 재위기에 500건이 넘는 것도 이 같은 위상을 잘 보여준다. 더불어 조선 전기의 문신 김계우, 중기의 문신 이헌국 등 80세 이상 장수한 인물들이 한우 고기를 즐겼다는 기록은, 소고기가 왕실을 넘어 민간에서도 장수 음식으로 여겨졌음을 뒷받침한다.
▲ 전통의 지혜, 과학으로 증명된 한우의 영양 가치
이처럼 전통 속에서 축적된 경험은 현대 과학으로도 뒷받침된다. 한우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 있어, 근육을 키우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호르몬과 효소를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고기의 헴철은 식물성 철분보다 흡수율이 2~3배 높아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다. 특히 월경으로 인해 철분이 많이 소실되는 여성이나,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지는 노인에게 중요한 영양소로 꼽힌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와 신경계 유지,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이고, 아연과 셀레늄은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준다. 전통적으로 ‘몸을 살리는 음식’으로 여겨진 한우가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건강한 보양식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한우자조금은 올해 ‘한우 잇(EAT)다’ 캠페인을 통해 전통 속에서 이어온 보양 음식으로서의 한우 가치를 현대인의 식탁 위에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조상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즐겼던 ‘약이 되는 음식’ 한우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다시금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한우는 고문헌과 왕실 기록 속에서 몸을 보하는 귀한 음식으로 자리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그 가치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우 잇(EAT)다’ 캠페인을 통해 한우의 보양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지켜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